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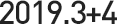



2017.10.10
무심코 길을 놓치고서 가을을 만나다

여행마저도 제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사는 게 그렇듯이 말이다.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행로를 정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날씨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온갖 사정이 다 생긴다.
그렇다고 해도 애초의 계획대로 밀어붙일 까닭은 없다. 여행의 목적지보다 거기까지 갈 때의 과정과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 여행의 길 위에 자주 멈춰 서서 샛길을 기웃거리는 건 이 때문이다.
글, 사진 박경일(문화일보 여행전문기자)
기웃거리다가 가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났다. 이 가을에 선물처럼 받은 길이다. 길의 실타래 한쪽 끝이 충북 영동의 절집 반야사이고, 다른 반대쪽 실의 끝이 경북 상주의 옥동서원이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넘나드는 이 길은 금강 상류의 실핏줄 같은 물길을 따라 줄곧 이어진다. 그 물길을 영동 쪽에서는 ‘석천’이라고 했고, 상주 쪽에서는 ‘구수천’이라고 불렀다.
석천, 또는 구수천의 계곡으로 이어지는 5.6km 남짓의 길은 놀랄 만큼 순하다. 길에다 유리판을 깔고 구슬 하나 가만히 올려놓으면 앞으로도, 뒤로도 구르지 않을 듯하다. 낙엽이 깔린 그림 같은 계곡 풍경을 끼고 걷는 내내 물소리와 새소리가 따라온다. 경관이 그윽하고, 걷기 또한 편안하니, 여기에 견줄만한 다른 길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솔직히 말하자면 본래 ‘길’이 아니라, 충북 영동의 절집 반야사를 찾아갔던 길이었다. 반야사는 원효대사의 제자 상원이 창건한 내력 깊은 절집. 절에는 세조가 이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피부병이 나았다는, 오대산 상원사와 똑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반야사는 한때 김천의 직지사보다 위세가 더 당당했다지만, 지금은 절집이 품고 있는 빼어난 가을 정취를 아는 이들만 드문드문 찾아든다. 송천의 물길이 휘감은 자리에 들어선 절집도 훌륭하고, 물가 벼랑에 매달아 지은 문수전에서 단풍 물든 계곡을 내려다보는 맛도 그만이다.

길을 만난 건 반야사 초입에서였다. 절집 앞에 물이 가둬진 보(堡)의 수면에 찍힌 단풍빛을 감상하다가 화살표가 그려진 낯선 팻말을 만났다. ‘둘레길’. 무엇의 둘레라는 얘기도 없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둘레길’이다. 기대는 없었다.
‘길의 들머리만 보고 되돌아 나가자’고 생각하고 들어섰지만 되돌아오지 못했다.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오솔길의 그윽한 정취와 전봇대 하나 없이 숲과 물로 이어지는 경관, 차고 맑은 물소리 사이로 잠깐잠깐 끼어드는 새소리….
그 길을 다 걷지 않고 돌아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한 시간 반 정도를 걸어 길 끝의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에 닿았다. 충청도에서 시작한 길이 경상도에서 끝난 셈이었다.

이 길에 붙여진 이름은 상주 땅에 당도해서야 알 수 있었다. ‘호국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길에다가 붙인 길 이름하고는…. 이유인즉 몽골제국 6차 침입 때 여기서 고려 승병이 대첩을 거뒀기 때문이란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활동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호국길’이란 이름은 너무했다. 그나마 도보 길을 처음 놓기 시작했을 때 붙였다는 ‘새천년길’의 무의미한 이름보다야 낫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길은 예전에도 한적한 길이었다. 모름지기 길이란 이쪽과 저쪽을 최단거리로 잇는 지름길이거나, 궁벽한 곳에서 번화한 곳으로 이어져 있을 때 바빠지는 법이다.
한데 이 길은 이쪽 끝에도, 저쪽 끝에도 궁벽한 마을만 있었을 뿐이니, 아주 잊히지만 않을 정도로 흐릿하다. 그래서 가을을 느끼려는 여행자가 걷기에 이만한 길이 없다.

길을 걷는 내내 따라오는 석천의 물은 우매리를 지나 금강의 지류인 초강천에 보태진다. 초강천변에는 영동을 대표하는 명승지 월류봉이 있다. 영동 땅의 금강 상류가 빚어내는 가장 빼어난 절경이다.
초강천의 물길이 절벽을 크게 굽이친 자리에 솟은 월류봉은 ‘한천팔경’의 제1경으로 가장 압도적이다.
월류봉의 경관을 완성하는 건 정자다. 몇 개의 봉우리 중 가장 앞쪽의 봉우리 끝에다 지난 2006년에 세운 정자는 마치 화룡점정 같다. 대개 자연에다 손을 대면 경관을 흩뜨리기 십상인데, 이곳의 정자는 오히려 근래에 지은 정자가 자연의 경관을 훨씬 더 빛나게 한다. 날렵하게 들어선 정자, 봉우리 아래를 굽이치는 초강천의 푸른 기운, 그리고 아름드리 감나무에 매달린 붉은 감, 주위를 노랗게 물들이는 단풍까지 한데 어우러지는 이즈음이 월류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가을의 쓸쓸함을 생각한다면 여정의 끝은 이곳이 좋을 듯하다. 한때 영남과 기호를 잇는 으뜸 고개였던 추풍령. 노래 가사 속에서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자고 가는’ 고개지만, 실제 추풍령은 오르막과 내리막도 잘 구분 안 되는 해발 220m 남짓의 작은 고개다. 기차가 추풍령을 넘어 다니던 시절 모여든 사람들로 흥청거리던 곳. 고속도로가 놓이고, 국도마저 잘라낸 산자락을 질러가면서 추풍령은 쇠락을 거듭했다. 기차는 하루 열 번쯤 추풍령역에 서지만 타고 내리는 승객은 거의 없다.
추풍령을 찾아가 역 앞 쇠락한 건물과 골목을 기웃거리는 일은 쓸쓸하다. 추풍령역 앞 정다방으로 들어서 양은 재떨이가 놓인 테이블 위에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놓고, 동네 노인들로부터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들 듣는 것도 쓸쓸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것.
지금 영동에서는 길도, 강물도 흘러가고, 계절도 저물어간다.

 : 양숙희(홍보팀)
: 양숙희(홍보팀)  : ysh@knto.or.kr
: ysh@knto.or.kr : 033-738-3054
: 033-738-3054 : 033-738-3881
: 033-738-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