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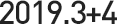



2017.11.07
예서 마음 한번 쉬어 가게나, 해남 암자기행

예서 마음 한번 쉬어 가게나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불교 예불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지극한 마음을 다 바쳐서 귀의한다는 뜻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연으로 귀의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신록과 녹음의 나무도 다 내려놓고는 빈손이 된다. 늦가을 여정으로 절집과 암자를 권하는 건, 거기서 ‘텅 비어 있음’의 시간을 만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모든 것들이 다 저무는 계절. 떨구고 비우는 일을 생각하며 해남 땅에서 적요한 절집과 암자를 찾아간다.
글, 사진 박경일(문화일보 여행전문기자)
대흥사 암자… ‘사라진 것‘이 ‘있는 것‘의 중심이 되다
해남이라면 누구나 대번에 떠올리는 절집이 대흥사다. 서산대사의 의발을 모셔둔 채 법맥을 이으며 위세를 키워 왔고, 구불구불 자란 소나무를 대웅전 기둥으로 삼았으며, 내로라하는 당대 문사의 글로 현판을 걸고 있는 절집. 대흥사의 그윽함이야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알 일. 대흥사를 무심히 건너 두륜산으로 들어가기로 한 건, 대흥사가 매혹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매력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었다.
대흥사가 두륜산에 거느리고 있는 산내 암자의 빛나는 아름다움은 아는 이들만 안다. 백화암, 청신암, 관음암, 진불암, 상관암, 일지암, 북미륵암, 남암….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발길을 붙잡는 곳이 만일암 터다. 두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가련봉 아래 자리 잡았던 만일암은 한때 두륜산 불법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다 허물어져 빈터로 남아있지만 큰 절 대흥사의 시작도 바로 이 암자였다. 북미륵암과 남암의 이름에 쓰인 ‘남’과 ‘북’의 방위도 다 만일암이 기준이다. ‘사라진 것’이 ‘있는 것’의 중심인 셈이다.

대흥사 숲속에서 성급해도 너무 성급한 동백을 만났다
만일암의 빈터는 텅 비어진 공간으로 오히려 충만하다. 암자 자리에는 본래는 7층이었으나 지금은 5층만 남아 있는 석탑이 대숲을 두르고 서 있다. 날렵하고 훤칠하게 솟은 석탑은 가련봉 암봉을 지붕으로 삼았다. 석탑 아래쪽에는 마른 가지로 활개를 치고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나무도 수도를 하는 것일까. 둥치며 가지가 성마르고 단단하다. 이름하여 ‘천년수’인데 실제 나이는 1000년에다 200년쯤을 더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남녀가 이 나무에 해를 매달아 시간을 붙잡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두륜산 만일암 터의 천년수. 천년수라지만 실제로 수령 1200년이 훨씬 넘은 나무다

미황사 부도전의 부도에 새겨진 소박한 조각들
북미륵암은 국보로 지정된 용화전 안 마애여래좌상이 압권이다. 4.85m 높이의 불상은 규모부터 보는 이를 압도하는데, 단단한 화강석을 마치 무른 비누처럼 깎아낸 솜씨에 이르러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봉긋 솟아오른 눈두덩이며 형형한 빛을 뿜는 눈, 부드러운 선을 가진 여래상 얼굴은 도무지 1000년 전에 깎은 것이라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미황사 암자… 죽음의 끝과 피안의 처음이 만나는 자리
미황사는 대흥사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대흥사가 시간의 깊이로 육중한 느낌이라면, 미황사에서는 단청이 지워진 대웅전의 모습처럼 막 세수한 듯 수수하고 단정한 기운이 느껴진다. 본디 미황사는 좀 헐거운 느낌이었다. ‘어딘가 좀 빈 듯한 느낌’이 주는 미감은 수수한 대웅전과 썩 잘 어울렸다. 그런데 중창 불사가 계속되면서 절집 안에 건물이 빼곡해졌다. 천만다행인 건 새로 들인 건물도 뽐내지 않고 반듯해 절집의 옛 정취를 흩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헐거웠던 공간이 좀 더 단단해지면서 나름의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해남 고천암호의 갈대숲. 갈대는 저무는 늦가을을 가장 화려하게 치장한다
미황사가 품고 있는 암자는 부도암 단 하나다. 부도암은 이름 그대로 부도밭을 거느린 암자다. 탑이 부처의 사리를 모셨다면, 부도는 고승의 사리를 담은 자리. 다 버리고 떠나는 죽음의 공간을 넘어가면 거기 피안의 세상이 있으니, 부도암은 죽음의 끝과 피안의 처음에 서 있다. 부도는 놓아둔 그대로 조형예술품이다. 서산대사의 제자였던 고승들의 부도탑에는 게와 물고기, 거북이 조각이 새겨져 있다. 위엄 있는 조각 대신 슬며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소박한 조각에서 느껴지는 건 권위로 제압해 사람들을 물러서게 하는 엄격함이 아니라 미소로 다가오게 하는 따스한 힘이다.
미황사가 기대고 있는 달마산에는 우리 땅의 암자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자리에 세워진 도솔암이 있다. 도솔암 지척에 미황사가 있지만, 뜻밖에 도솔암은 대흥사에 속한 암자다. 도솔봉 코앞까지 차로 올라 공룡의 등줄기 같은 암봉 능선을 20분쯤 따라가면 거기 도솔암이 있다. 도솔암으로 드는 산길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왼쪽으로는 진도 앞바다를, 오른쪽으로는 완도의 바다를 끼고 걷는 이 길은 마치 하늘을 딛고 걷는 듯하다. 도솔암은 아슬아슬한 암봉을 축대로 막은 자리에 있다. 이른 아침 홀로 예불을 마친 스님이 손바닥만 한 마당 한쪽에 쌀 반 줌을 놓아두자 박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산정의 암자와 거기 기거하는 스님, 그리고 그 스님에게 보시를 받는 새 한 마리가 마치 동화의 장면 같은 풍경을 빚어냈다.

해남 달마산의 도솔암. 불꽃 같은 암봉의 심지 자리에 들어서 속세를 굽어보고 있다
위봉산 암자… 죽음 앞에 섰던 스님의 20년 두문불출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암자 하나 더. 두륜산이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다 다시 우뚝 일어선 위봉산의 거친 암봉 아래 성도사가 있다. 본디 대흥사의 말사로 초의선사가 참선했다는 절집이다. 대흥사와 미황사의 위세에 밀려 외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해남 사람도 아는 이들이 드문 절집이지만, 거친 바위 아래 완도 앞바다를 너른 마당으로 삼고 있는 자리가 워낙 빼어난 곳이다.
성도사는 일제강점기 호남 의병의 거점이었다. 1909년 성도사 일대에서 1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린 의병장 황일두가 일본 토벌군과 맞섰다가 목숨을 잃었고, 1933년에는 항일운동해방투쟁 비밀 결사단체인 ‘전남협의회’가 여기서 결성되기도 했다. 6·25전쟁으로 절집은 폐허가 됐지만, 훗날 찾아든 스님이 무너진 절집 곁에 토굴을 지어 지금까지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해남 위봉산의 성도암
성도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 대웅전 앞의 여의주 바위. 요사채를 지나서 돌문 형상의 바위를 지나면 벼랑에 대웅전이 서 있고 그 옆의 벼랑에 거대한 공깃돌 같은 바위가 떨어질 듯 아슬아슬 놓여 있다. 둥근 바위가 구르지 않고 어찌 저런 자리에 올라 있는지 볼수록 신기하다. 성도사는 28년 전에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서 기다시피 산을 올라왔다는, 부드러운 눈매의 화광 스님이 지키고 있다. 몸이 다 망가져 의사는 ‘서너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화광 스님은 음식과 수도로 스스로 치유했단다. 암자로 오른 뒤 몇 년 동안은 산 아래 마을을 다녔지만, 최근 2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산을 내려간 적이 없다고 했다. 노스님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한 세월 다 보내버렸는데 내려가 기웃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성도사 대웅전 옆 여의주 바위. 거대한 바위가 암봉 위에 거짓말처럼 올려져 있다
성도사 선방에서 내려다본 바다가 은박지처럼 반짝거렸다. 발아래로 가을걷이를 끝낸 논들이 펼쳐졌다. 가을 끝자락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뎅그렁’ 하고 흔들었다. 화광 스님의 독경 속에서 ‘지심귀명래’ 예불의 첫 구절을 다시 떠올렸다. 가을에 모든 ‘귀의하는 것’들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 양숙희(홍보팀)
: 양숙희(홍보팀)  : ysh@knto.or.kr
: ysh@knto.or.kr : 033-738-3054
: 033-738-3054 : 033-738-3881
: 033-738-3881